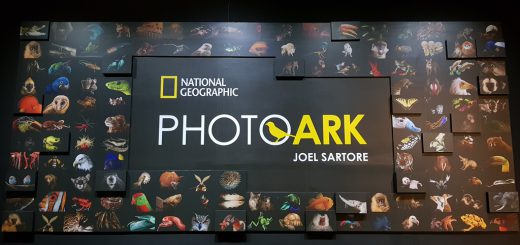한중일 세 나라의 호랑이를 비교해 보자. “동아시아의 호랑이 미술”
“동아시아의 호랑이 미술” 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두달간 진행하는 특별전시다. “호랑이” 를 소재로 하는 한-중-일 삼국의 예술작품을 모았다. 호랑이에 대한 작품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니 그나름대로 운치가 있다.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이 백호라, 올림픽을 기념한 전시라고 홍보되고 있다.

소박한 전시였고 입장료도 3천원으로 저렴하다. 작은 전시 공간에는 한중일 호랑이를 주제로 한 회화, 도예, 조각 등이 국가별로 나란히 전시되어 있다. 세 나라가 호랑이를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구경하는 것이 관람 포인트다.
전시 공간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국관 – 일본관 – 중국관 순으로 각 국의 호랑이 미술을 전시하고, 가장 안쪽에는 “백중지세 – 호랑이 미술의 걸작” 이라 하여 삼국에서 내세울 최고 작품 각 한 점씩이 전시되어 있었다.
한민족의 신화, 한국의 호랑이

거대한 화폭에 용과 호랑이를 짝을 이뤄 그렸다. 용과 호랑이를 같이 그린 용호도는 새해에 액막이 그림인 세화(勢畵) 로 선호되었다.

한국 전시관 중앙에는 김홍도가 그린 두 작품, 송하맹호도(松下猛虎圖), 죽하맹호도(竹下猛虎圖) 가 나란히 걸려 있다.
가장 안쪽에 전시되어 있는 맹호도(猛虎圖) 까지 합해 조선의 3대 호랑이 회화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 세 작품이 동시에 전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죽하맹호도는 개인소장으로 언제 다시 구경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들 세 작품 속의 호랑이 화풍은 매우 비슷해 보인다. 셋 중 둘이 김홍도의 호랑이라 더욱 그렇다.
위의 두 작품에서 호랑이는 김홍도가 그렸되, 소나무와 대나무는 강세황과 임희지가 그렸다. 두 화가의 합작품이라 하겠다. 김홍도는 풍속화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불화, 길상화, 인물화 등 거의 모든 장르에서 최고인 천재화가였다.

이 그림은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에서 친근하게 보던 민화, “까치와 호랑이” 다. 상서로운 동물인 까치와 호랑이를 같이 그려 넣었다. 회화의 테크닉은 앞선 그림들 보다 떨어진다. 당시 기준으로 오늘날의 만화와 같은 작품이였을 것이다. 호랑이 주위를 잘 살펴보면 깨알같은 새끼 호랑이들도 감상 포인트다.
무용과 불법의 수호자, 일본의 호랑이
일본 호랑이 그림은 주로 승려들에 의해 그려진 것이 많다. 그래서 “불법의 수호자” 라고 표현했다. 무사 문화가 발달했던 일본에서는 승려들이 문(文)을 책임지던 지식인 계층으로 문화, 예술에 기여 했다. 선종 사원에 유입된 중국 송대의 용호도의 영향으로 당시 일본에서는 용호도가 유행했다.

일본 전시관 바로 앞에는 호랑이와 용을 그린 거대한 병풍이 한면 벽을 장식하고 있다. 사람 키보다 더 큰 병풍속 용과 호랑이는 보는 이를 앞도한다. 무를 숭상하던 일본에서는 용호를 웅장하게 그리는 것을 선호했을 것이다.
이 작품은 17세기 화가인 다와라야 소세쓰(俵屋 宗達)가 그린 병풍이다. 그는 쿄토에서 그림가게 다와라야(俵屋) 를 운영하던 화가였다. 작은 그림가게 주인이었지만 훌륭한 그림 솜씨로 당대에 뛰어난 화가에게 주는 호칭인 홋쿄(法橋)를 받은 대단한 인물이었다.

에도 시대에는 무사들이 입는 전투용 겉옷 진바오리(陣羽織) 에도 용과 호랑이를 그려 넣었다.

에도시대 화가인 마루야마 오쿄(圓山應擧)가 1786년 그린 호랑이 그림이다. 중세시대 일본 호랑이는 호랑이 답지 않게 그려진다. 섬나라 일본에는 호랑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중세 일본에서는 호랑이를 그릴 때 고양이를 참고로 그리곤 했다. 그림 속 호랑이 눈을 보면 고양이 눈이다. 또한 앞발을 나란히 모은 폼은 고양이의 자세다. 한국 맹호도에서 보이는 호랑이 그림을 다시 보자. 호랑이는 저렇게 앞발을 가지란히 모으지 않는다.
벽사의 신수, 중국의 호랑이
중국 전시관에는 회화보다 도기, 조각 등의 조형물이 더 많았다. 중국은 문화적으로 호랑이 회화는 선호하지 않았던 것일까, 아니면 이번 전시에서 중국 호랑이 회화를 들여오지 못한 것일까. 아직 그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청나라 시대 그림자극에서 사용된 호랑이 가죽 인형이다. 턱, 목, 허리, 네개의 다리와 꼬리를 배우가 움직일 수 있게 제작되어 있다.

호랑이로 만든 배게. 호랑이 모습이 귀엽다. 나무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기로 만들었다. 베게 등부분에는 “낮에는 경전을 싣고 밤에는 호랑이 허리를 베고 눕네. 그 꼬리를 밟을 이 없고 누가 감히 그 수염을 건드리겠는가” 라고 써 있다. 호랑이를 베고 잔다는 우쭐한 기분이 이랬을 거다.
백중지세 한중일 호랑이 미술의 걸작
가장 안쪽에는 3 점의 작품만 걸려있다. 중앙에는 한국의 “맹호도” 가 있고, 양 옆으로 중국과 일본의 대표작이 한점씩 있다. 이번 전시에서 나온 작품들 중에서 가장 귀한 세 작품을 걸작으로 칭하며 따로 전시한 것이다.

중국 상나라(기원전 1천년) 시대 호랑이 장식 꺽창으로, 약 3천년이나 지난 물건이다. 저 청동부를 창대에 달아서 갈고리처럼 무기로 썼다. 이번 전시의 출품작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물건이다.
대만 고궁박물원을 갔을 때 기원전에 만들어진 수 많은 전시품들에 감탄을 한 기억이 난다.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많은 유물이 파괴되었음에도, 아직도 중국에는 수천년이 넘는 유물이 많다. 오랜 역사를 가진 중국의 힘이 새삼 느껴진다.

불교 혹은 도교의 존상과 용, 호랑이를 결합시킨 3폭의 용호도는 일본 호랑이 미술의 특징이다. 이 병풍은 에도시대의 어용화가 가노 나가노부(狩野榮信) 의 세 아들이 각각 한폭씩 그린 그림이다. 선종의 상징 유마거사(維摩居士) 옆에 그 가르침을 받는 호랑이와 용이 나란히 그려졌다. 500 년이 되어 가는 작품인데 보존상태가 정말 좋다.

한국 호랑이 미술의 최고봉으로 이 맹호도가 선정되었다. 낙관에는 조선시대 화가 심사정의 호 “현재(玄齋)” 가 찍혀 있으나 낙관을 찍은 연도와 심사정의 생몰연도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작품의 진짜 화가가 누구인지는 아직 모른다.
그림 속 호랑이는 김홍도의 호랑이와 일견 비슷하다. 세로의 좁은 화폭에 호랑이를 담다보니 몸을 구부린 호랑이가 화폭에 꽉 차는 느낌이다. 윤곽선을 그리지 않고 터럭 하나하나를 묘사하여 호랑이를 그려낸 세밀함이 대단하다. 그림 중앙을 보면 호랑이 허벅지와 허리가 만나는 부위에 털이 소용돌이처럼 치는 표현이 있다. 이는 실제 고양이과 동물 호랑이의 털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런 표현은 호랑이의 미간에도 나타난다.
가벼운 마음으로 동아시아의 호랑이 회화를 감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2년 전 한중일의 박물관 관장들이 모여 삼국을 돌아가며 교류회를 갖기로 했다. 그리고 매 2년마다 국립중앙박물관, 도쿄국립박물관, 중국 국가박물관은 서로의 전시품을 공유하는 전시회를 열고 있다. 이번 전시는 그 것의 일환이다. 덕분에 일본과 중국 호랑이 구경도 했다. 같은 호랑이가 나라마다 어떻게 표현되는지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다.
– 동아시아의 호랑이 미술-韓國・日本・中国-
ㅇ 기간: 2018. 1. 26.(금) ~ 3. 18.(일)
ㅇ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상설전시관 1층)
ㅇ 전시품: 한국, 일본, 중국의 호랑이 관련 회화, 조각, 공예품 등 105건
ㅇ 입장료: 성인 3,000원 / 초중고 대학생 2,500 원 / 65세 이상 및 유아 (5~7세) : 2,000원